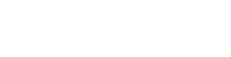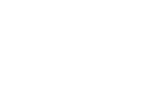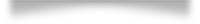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4]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 산정시 공제할 금액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2관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제4관의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한편,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다.
[4]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할 금액은 그 공무원의 사망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제61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아니라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거나 받을 급여액이다.
【참조조문】
[1]민법 제393조, 제763조
[2]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60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3]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3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4조
[4]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60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판결(공1983, 1738),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공1989, 734)
[2]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 255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공2000하, 1380)
[3]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공1992, 926),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공1996하, 322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9. 11. 선고 98나37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망 소외인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2관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제4관의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한편,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규정이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할 금액은 그 공무원의 사망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5항, 제61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아니라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거나 받을 급여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소외인이 정년 퇴직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 합계 금 124,983,609원에서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한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으로 계산한 금 110,529,738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고, 위 소외인의 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에서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소외인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수령한 급여인 금 70,665,809원(원심판결은 이를 기수령퇴직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급여금을 소외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을 공제한 금액을 위 소외인의 일실퇴직급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한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금액과 원고들이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현실로 수령한 급여액 70,665,809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외인의 소극적 손해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